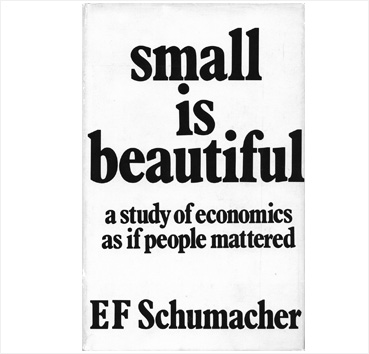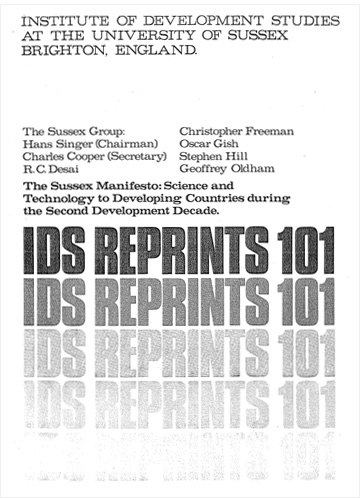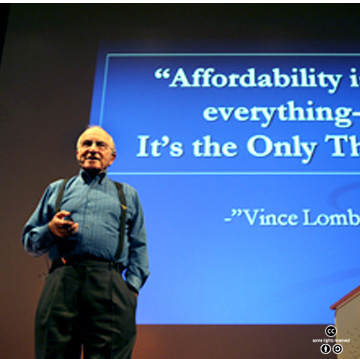|
현재의 적정기술 활동

현재 영국의 프랙티컬 액션(Practical Action, 전 ITDG), 독일 국제협력단(GIZ,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전 GTZ), 네덜란드 개발기관(SNV, Stichting Nederlandse Vrijwilligers) 등 선진국의 기술 원조 기관들, 국제개발기업(IDE, International Development Enterprises), 킥스타트(KickStart, 전 ApproTEC) 등의 사회적 기업들, MIT의 D-lab 등 공과대학의 정규 프로그램, 그 외 수많은 NGO 단체들이 제 3세계를 위한 기술 개발 및 원조 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대안기술과 관련해서도 미국, 영국, 호주 등지에 공공 기관이 존재하며,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샥티(Grameen Shakti), 라오스의 선라봅(Sunlabob), 인도의 셀코(SELCO) 등 개도국 내에 설립된 사회적 기업들 역시 적정기술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도 ‘적정기술 붐’이 일었다고 말해질 정도로, 적정기술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급증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나눔과기술,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 등 과학기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모임들과 굿네이버스, 팀앤팀, 대안기술센터 등의 NGO 단체들, 한밭대학교 적정기술연구소, 한동대학교 그린 적정기술 연구협력 센터와 같은 대학 내 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생겨나면서 민간 차원에서 크고 작은 적정기술 개발 활동이 시작되었다. 2009년에 한국이 공식적으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적정기술 운동에 순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